|
상생의 땅 가야산 ① 왜 가야산인가.
화합의 산문 활짝 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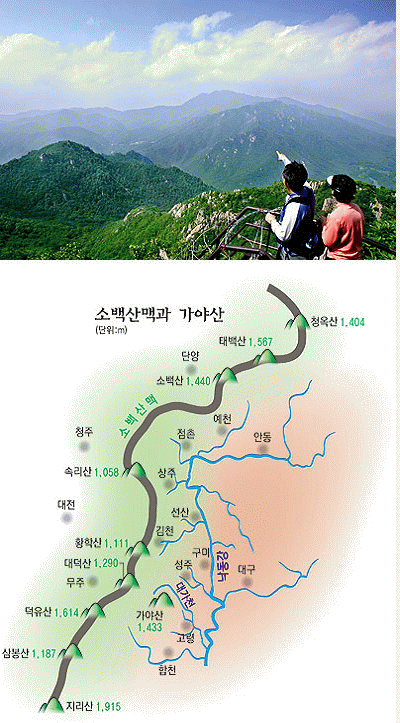
▲ (사진 위)해인사 남쪽 남산제일봉에서 바라본 가야산. 넉넉한 품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종교·신앙 간 융합을 이루게 한 가야산에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인간에게 산(山)은 무엇인가? 서양인에게 산은 신(神)을 만나는 통로 역할을 했다. 그리스인들은 높다란 언덕에 신전을 지었고, 기독교인들은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다.
그와 달리 동양인에게는 산 자체가 숭배 대상이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 산은 아름다움의 대상만이 아닌 신성한 존재였다. 산지가 3분의 2나 되는 지리적 환경 때문이었으리라. 여기에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신령(神靈)사상' 덕분에 산은 오래전부터 신령스런 존재로 받들어졌다.
'화합의 여신'
산에 대한 사람들의 신령스런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산신(山神). 큰 산은 물론 작은 산에도 각양각색의 산신들이 있다. 국토의 근간인 소백산맥에서 동쪽으로 살짝 비껴나 우뚝 솟은 가야산(伽倻山). 영산(靈山)이란 수식어에 걸맞게 이곳에도 산신이 살고 있다. 가야산처럼 높고 성스런 기품과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정견모주(正見母主)'란 여신이다.
아득한 옛날 하늘신 '이비하'와 감응한 가야산 여신 정견모주는 두 아들을 낳았다. 대가야를 연 이진아시왕과 금관가야 시조인 수로왕이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전설에 우리가 새삼 주목하는 이유는 산신과 천신의 '감응'으로 새 나라를 연 인물들이 태어났다는 데 있다. 하늘을 숭배한 부족, 곰을 경건하게 받든 부족 간 연합으로 고조선이 세워진 것처럼, 대가야와 금관가야도 하늘과 가야산을 신성하게 받든 부족들의 '화합'으로 나라를 열었다. 새 나라, 새 세상을 만드는 데 신성한 땅, 가야산이 터가 됐음은 물론이다.
불(佛)·유(儒)·선(仙), '공존의 땅'
어떤 종교나 사상, 주의(主義)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본류보다 오히려 격(激)해지는 습성이 있다. 호리병처럼 생긴 반도(半島) 특유의 기질 때문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같은 흐름은 적잖은 폐해를 낳았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학문과 종교,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티격태격한 게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화합의 힘으로 새 세상을 연 가야산. 그 넉넉한 산세와 후덕한 기품으로 불교와 유교는 물론 풍수지리, 산악·무속신앙의 성지(聖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아가 불교와 유교, 풍수지리 사이에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흐름을 가야산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야산은 화합의 산, 상생(相生)의 산으로 일컬어진다.
아픔을 승화시켜 주는 산!
가야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신라 말 학자인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세상사에 좌절한 그를 가야산은 넉넉한 품으로 안아줬다.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인 월광과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둘째 아들 김황. 망국의 아픔을 지닌 두 사람에게도 가야산은 안식처가 됐다. 가야산에 몸과 마음을 기댄 사람들은 이들뿐만 아니다. 유학자와 문인들에게 가야산은 유람과 풍류의 이상향으로 여겨졌다. 비단 유람의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 "높은 곳에 오르는 뜻은 마음 넓히기를 힘씀이지 안계(眼界·시야) 넓히기를 위함이 아니다."는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말처럼 그들은 가야산에서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터득한 것이다.
상생의 법을 찾아서
시끄러운 세상이 더욱 시끄러워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란 큰 다툼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서인지 세상사가 혼탁스러워지고, 살벌하기까지 하다. 인구에 회자됐던 상생이란 말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는커녕 서로를 해(害)하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들이다. 상극(相克)의 세상이란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정녕 상생은 요원한 것인가?
그 땅의 덕이 해동에서 제일이라는 가야산. 넉넉한 가야산은 산을 찾은 이들에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줬고, 선인(先人)들은 그 상생의 법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진솔한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가 가야산에 오르는 것도 가야산의 절경에 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화합의 산 가야산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여는 법(法)을 배우기 위해서다.
매일신문. 글·이대현기자 sky@msnet.co.kr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사진·박노익기자 noik@msnet.co.kr |